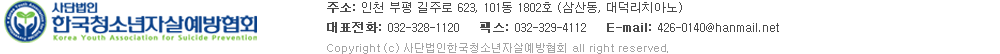|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열여섯 살 소녀의 8세 여아 살해 사건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여아를 살해한 A양(16)은 최근까지 우울증과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았다고 알려졌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사소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 자체가 범죄나 자살 등 극단적 행동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방치 했을 때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 '관심군' 24% 사실상 방치
9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초·중·고교생 10명 중 2~3명은 전문적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교사 관찰 등으로 수집한 통계 결과다. 조사대상 학생 수는 6만5528명(표본조사)이다.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중 정신과 병·의원이나 교육청 산하 학생상담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된 비율은 76%에 그쳤다. 관심군은 자살 위험 등이 있는 학생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나머지 24% 관심군 학생들은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당국이 폭력 징후나 자살 생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매년 검사를 시행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와 모두 연결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음주, 흡연, 약물중독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적 일탈 수준을 벗어나 범죄에 손을 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살 등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청소년 정신과 치료, 부모 인식부터 바꿔야…전문가 "편견이 상황 악화"
방치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모의 인식 개선이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실제 부모의 편견은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를 막는 큰 걸림돌이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아이'로 낙인 찍힐까 하는 두려움에 부모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사 등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거부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선입견과 오해가 조기 치료를 막아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현주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소장(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교육부 등 제도권이 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을 기울여도 부모가 치료 동의를 안 해 질환이 악화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청소년은 초기 치료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병리들이 많다"고 밝혔다.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최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정신건강은 음주, 흡연 등 부정적 생활 행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흡연 혹은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자살 생각을 할 위험이 1.3~1.5배 높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여건 어려운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도 시작
경제적 여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손잡고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중 자살위험이나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고위험군임에도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학생 약 600명이 3년 동안 연간 10억여원의 치료 지원을 받는다.
이종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으로 부정적인 인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위험군 학생들이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 받게 됐다"며 "학생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